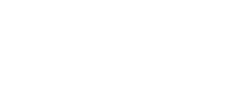풍수지리와 명당이란
페이지 정보
본문
풍수지리와 명당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땅에 대한 기의 인식이 발달했으나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학문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땅에 대한 독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후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가 전래된 후 중국과는 다른 우리식의 풍수지리를 발전시켰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우리의 독자적 풍수서가 저작되기도 했다.
통일신라시대 도선(道詵)이라는 선승에 의해 한반도 풍수지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도선에게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보사상(裨補思想)으로서 중국과 다른 한반도 풍수지리의 특성이다. 즉 주어진 땅의 지기에 의지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거나 가산(假山)을 만들고 사찰과 탑 등의 입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땅의 지기를 인간의 삶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비보로서 한반도 풍수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지기로서 이루어진 살아 있는 땅에 인간이 어떻게 잘 조화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땅은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스스로 그러한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이 조화해서 살아야 한다. 인간이 조화하기 어려운 땅이 인간의 눈에는 좋지 못한 땅으로 보일 뿐이다. 자연 그자체로서는 선악의 판단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다. 땅과 조화할 수 있는 기반은 인간이 땅의 기를 느껴서 자신과 잘 맞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지기에 대한 접근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땅의 모양을 눈으로 봄으로써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형국론(形局論)이다.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연화부수형(連花浮水形)·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 등 어떤 지역의 땅을 호랑이·소 등의 짐승이나 매화·연꽃 등의 식물, 또는 사람 등의 모양으로 규정하고 땅에 비유된 동식물들의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생기(生氣)가 모이는 혈(穴)을 찾는다. 학이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라면 알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된다. 만약생기를 느낄 수 있다면 굳이 학 모양을 그리지 않고서도 알이 놓이는 곳을 기감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기가 수반되지 않은 형국론은 공허하며 이런 점에서 명당을 찾는 일은 땅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지 않고서 단지 어떤 도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기를 바탕으로 한 형국론은 땅을 살아 있는 것으로 보는 풍수지리의 정신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천리 방방곡곡 풍수지리는 형국명이 붙지 않은 곳이 별로 없을 정도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길지(吉地)를 찾는 노력으로 간룡법(看龍法)·장풍법(藏風法)·득수법(得水法)·좌향론(坐向論)·정혈법(定穴法) 등의 경험적 지기인식을 위한
이론체계가 있다.
간룡법은 우리 땅의 연원인 백두산, 즉 태조산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마을뒷산, 즉 주산(主山)에 이르는 산맥이 힘있게 끊어지지 않고 잘 달려왔는가를 보는 것이다. 풍수지리에서는 지기의 흐름인 산맥을 용(龍)으로 본다. 생기가 넘치게 뻗은 용을 보통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간룡의 요체는 조산(祖山)에서 주산을 거쳐 혈장에 이르는 맥의 연결이 생기발랄한가를 보는 것이다.
장풍법은 주산을 중심으로 명당주변의 산세를 살피는 방법이다. 명당주변의 산세가 포근하게 사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무정하게 돌아앉았거나 외면하는 산세는 좋지 못하다. 가장 전형적인 장풍법은 사신사(四神砂)의 구조를 살피는 것이다.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남주작(南朱雀)·북현무(北玄武)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는 서울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다.
혈을 정하는 것이 정혈법이다. 땅에도 몸과 같이 경락(經絡)의 체계가 있고 혈이 있다. 이 혈기는 경락을 타고 흐르던 기가 잠시 멈추는 기의 정거장과 같은 장소이다. 그러므로 한방에서 침을 혈에 놓게 되는데 혈을 벗어나면 효험을 기대할수 없다. 이와 같이 명당에서 혈을 찾는 것도 침구술과 같이 털끝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명당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 그만큼 정혈은 어려운 것이다. 서울의 혈처는 경복궁이 된다. 명당의 중심이 혈이기 때문에 도읍이나 마을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이곳에 입지하게 된다.
지관이 명당(明堂)을 점지하거나 감결(鑑訣)하는 행위를 우리는 전래적으 로 풍수(風水)라고 일컬어 왔다. 풍수지리에서 땅은 살아 있으며 능동적으로 보고 만물을 키워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활력의 정도에 따라 인간에게 길흉화복(吉凶禍福)이 오는 것으로 보았고 땅에 존재하는 생기(生氣)가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양택(陽宅)이란 인간이 거주지역의 풍토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과정 에 지형의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양한 지역차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탐색하고 연구 개척하여 사실적(寫實的)이고 계량수학적(計量數學的) 방법 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적 학문이라는데 대하여 이의 (理義)가 없다 하겠다. 또한 음택(陰宅)이란 혈처(穴處)에 선조의 체백(體 魄)을 모시어 유골이 황골(黃骨)로 오랫동안 보존 할 수 있는 곳을 현실 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니 이 또한 과학인 것이다.
명당이란?
대체로 혈(穴)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청룡(靑龍) 백호(白虎)에 둘러 쌓인,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의 일정한 공간을 명당이라고 한다.
혈은 음택(陰宅)에서 유골(遺骨)이 안치된 자리, 즉 주택(住宅)에서는 안방으로 인간이 주로 머무는 정적(靜的)인 장소로 활용된다.
명당은 주택으로서는 마당, 마을이지만 무덤의 경우에는 그 앞에 펼쳐지는 넓은 들판으로 인간이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동적(動的)인 장소이다. 어머니의 자궁같은 땅, 이것을 풍수에서는 명당(明堂)이라고 부른다. 명당을 찾아 가는 행위는 인간의 원초적 고향을 찾아 떠나는 행위이다. 우선적으로 바람과 기(氣)가 모여 갈무리가 되는가를 살피고 산(山)의 앞면과 뒷면 의 안온(安穩)여부를 살피는것이다.
전수징혈(前水澄穴)이란 혈(穴) 앞의 명당과 혈 앞을 흐르는 물과의 관계에서 결혈(結穴) 의 확고한 위치를 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명당(明堂)이란 혈(穴) 앞의 평탄한 장소로서, 마치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정사를 의논하는 장소 같다는 것으로서, 이곳 역시 생기가 모이고 멈추는 곳이므로 명당 이라하면 바르고 평평해야 한다. 기울거나 옆으로 넘어진 듯하면 생기를 용결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명당이 아니며, 이러한 명당의 뒤편에서 진혈 이 맺어지는 예는 없다.
명당에는 대.중.소의 세 가지가 있다.
소명당(小明堂)은 혈 앞의 작은 것,
중명당(中明堂)은 청룡과 백호의 안쪽이 있는 것,
대명당(大明堂)은 안산(案山) 안쪽에 있는 넓은 것이다.
출처-다음 (백과사전) 풍수지리학